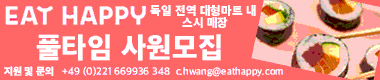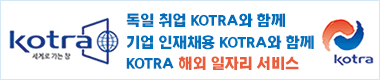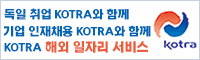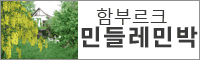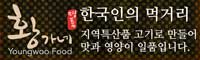철학 헤겔미학(10)
페이지 정보
작성자 서동철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조회 4,121회 작성일 08-02-10 12:37본문
자연미와 예술미(1)
그 – 자연과 예술, 서양 철학과 언어예술에서 심심찮게 거론되는 대표적 주제들이지 싶어.
나 – 자연적 아름다움과 예술적 아름다움 또한 이에서 파생된 말거리라 할 수 있어. 근데 갑자기 왜 이를 붙잡는 게야?
그 – 휄덜린의 시를 읽고 있는 중이거든. 제목이 바로 ‘자연과 예술’이야. 원 제목은 Natur und Kunst oder Saturn und Jupiter.
나 – 어쪄? 마음에 들어?
그 – 응, 그래 읽고 또 읽고 또 거듭 읽고 있어. 단지 그가 이 시를 통해 무슨 뜻을 나타내고자 했는지 보다 더 명확한 모습을 그릴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싶어. 혹시 니가 이리 애 쓰고 욕 보는 나를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. 너 휄덜린 팬이잖아.
나 – 그 시 내용에 대한 내 나름대로 풀어헤침에 지금은 별로 마음이 내키지 않어. 단지 이 시의 이해를 위해선 제목부터 뜯어봄이 필요하다는 말은 할 수 있겠지. 특히 뒷 부분, 왜 ‘Saturn und Jupiter’인가 말이지.
그 – 로마신화를 참고하라는 소리구만. 틀린 말은 아닌 듯 해. 단지 이 또한 간단치 않은 게 Saturn의 자리매김이 일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인상을 받았거든. 한편으론 자기 아들 Jupiter를 잡아먹고자 했던 폭력군주적 모습이고 또 다른 한편 ‘풍요의 신’으로 풍부한 자연을 대변하는 모습이 보이니 말이야.
나 – 그러한 로마신화의 원본적 내용에 그리스신화와의 미세한 차이에 대한 앎과 아울러, 사실 이게 어쩌면 더 중요한 휄덜린의 메세지인데, 신화의 현대화를 위한 외침이 그 시에 스며들어 있다고 봐. 왜냐하면 그 신화를 노래하는 시적 주체가 지금여기의 사람이라는 점을 시는 뚜렷하게 밖으로 내보이고 있잖아.
그 – 거기에 덧붙여 Natur und Kunst, 즉 자연과 예술이 맞물려 돌아가고.
나 – 내 말한대로 더 이상 이 시 속으로 침잠함에 오늘은 좀 그렇고. 대신 그럼 헤겔이 이에 대해 어찌 말하고 있는가에 대해 얘기해 보는 게 어때? 물론 헤겔이 휄덜린의 시에 대해 어찌 왈가왈부했는지를 따지자는 소리가 아니라, 그가 그런 적도 없고, 그가 자신의 미학강의에서 자연미와 예술미에 대해 어찌 가르치는가를 살펴보자는 말이야. 혹시 알아, 이게 또 휄덜린의 그 쉽게 이해되지 않는 시를 소화시키는데 도움을 줄지. 직접적인든 간접적이든 말이야.
그 – 하기사 자연과 예술을 대립각을 바라보는 모습은 이미 옛 그리스 시대의 소피스트들에서 엿볼 수 있지. 그만큼 철학사에서도 오래 전부터 다루는 주제야. 또 그만큼 꿰뚫어 보기가 여의치 않는 철학적 먹거리란 말이기도 하고. 그렇지 않다면야 이를 두고 계속 머리를 굴릴 이유가 없거든. 단지 휄덜린이 위 시에서 노래하는 자연과 헤겔이 자신의 미학강의에서 말하는 자연미의 그 자연과의 사이에 과연 어떠한 공통분모가 있는지에 대해선 내 나름대로 조금은 강한 물음표를 찍고 싶어. 뭐라 할까, 하늘과 땅의 차이라고나 할까, 아니 오히려 신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과의 차이라 하는 편이 낫겠구만.
나 – 인간적인 자연이라…
그 – 신적인 것이 나타내는 숭고함과는 또 다른 감각적 아름다움을 말하고자 했어.
나 – 허나 헤겔 역시 자연미의 맥락에서 양쪽을 모두 말하고 있는데…, 물론 지나가며 한 마디 던지는 식이지만 말이야.
그 – 내 보기에 문제의 핵심, 즉 자연미와 예술미를 가르는 중요 잣대는 우리 내지는 우리 의식에 보이는, 즉 주어진 아름다움이냐 아니면 우리 내지는 우리 의식이 만들어 내놓은 아름다움이냐의 가름이 아닐까 싶어. 짧게 말하자면 수동성과 능동성의 차이라고나 할까?
나 – 한 마디 거들자면, 헤겔은 자연미를 말하며 이는 자연 그 자체가 갖고 있는 아름다움이라기 보다는, 니가 말하듯, 인간의식에 아름답게 비치는 그런 것을 가리킨다고 뚜렷히 밝히고 있어. 칸트식으로 말해 ‘물자체’라기 보다는 ‘현상’ 즉 ‘나타남’이라는 말이지.
근데 헤겔철학을 이해함에 있어, 그의 미학이든 형이상학이든, 가장 중요한 점은 그 철학의 내적 운동성을 파악하는 게 아닐까 싶어. 소위 변증법으로 그려지고 있는 이러한 꿈틀거림을 제대로 그릴 수 있어야만 그가 종국적으로 무엇을 말하고자 했는지에 대해 그와 제대로 대화를 나눌 수 있거든. 예컨대 자연미는 왜 그리고 어떻게 예술미로 ‘나아갈’ 수 밖에 없는가 하는 물음에 대한 답을 구해 보는 게지.
그 – 자연과 예술, 서양 철학과 언어예술에서 심심찮게 거론되는 대표적 주제들이지 싶어.
나 – 자연적 아름다움과 예술적 아름다움 또한 이에서 파생된 말거리라 할 수 있어. 근데 갑자기 왜 이를 붙잡는 게야?
그 – 휄덜린의 시를 읽고 있는 중이거든. 제목이 바로 ‘자연과 예술’이야. 원 제목은 Natur und Kunst oder Saturn und Jupiter.
나 – 어쪄? 마음에 들어?
그 – 응, 그래 읽고 또 읽고 또 거듭 읽고 있어. 단지 그가 이 시를 통해 무슨 뜻을 나타내고자 했는지 보다 더 명확한 모습을 그릴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싶어. 혹시 니가 이리 애 쓰고 욕 보는 나를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. 너 휄덜린 팬이잖아.
나 – 그 시 내용에 대한 내 나름대로 풀어헤침에 지금은 별로 마음이 내키지 않어. 단지 이 시의 이해를 위해선 제목부터 뜯어봄이 필요하다는 말은 할 수 있겠지. 특히 뒷 부분, 왜 ‘Saturn und Jupiter’인가 말이지.
그 – 로마신화를 참고하라는 소리구만. 틀린 말은 아닌 듯 해. 단지 이 또한 간단치 않은 게 Saturn의 자리매김이 일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인상을 받았거든. 한편으론 자기 아들 Jupiter를 잡아먹고자 했던 폭력군주적 모습이고 또 다른 한편 ‘풍요의 신’으로 풍부한 자연을 대변하는 모습이 보이니 말이야.
나 – 그러한 로마신화의 원본적 내용에 그리스신화와의 미세한 차이에 대한 앎과 아울러, 사실 이게 어쩌면 더 중요한 휄덜린의 메세지인데, 신화의 현대화를 위한 외침이 그 시에 스며들어 있다고 봐. 왜냐하면 그 신화를 노래하는 시적 주체가 지금여기의 사람이라는 점을 시는 뚜렷하게 밖으로 내보이고 있잖아.
그 – 거기에 덧붙여 Natur und Kunst, 즉 자연과 예술이 맞물려 돌아가고.
나 – 내 말한대로 더 이상 이 시 속으로 침잠함에 오늘은 좀 그렇고. 대신 그럼 헤겔이 이에 대해 어찌 말하고 있는가에 대해 얘기해 보는 게 어때? 물론 헤겔이 휄덜린의 시에 대해 어찌 왈가왈부했는지를 따지자는 소리가 아니라, 그가 그런 적도 없고, 그가 자신의 미학강의에서 자연미와 예술미에 대해 어찌 가르치는가를 살펴보자는 말이야. 혹시 알아, 이게 또 휄덜린의 그 쉽게 이해되지 않는 시를 소화시키는데 도움을 줄지. 직접적인든 간접적이든 말이야.
그 – 하기사 자연과 예술을 대립각을 바라보는 모습은 이미 옛 그리스 시대의 소피스트들에서 엿볼 수 있지. 그만큼 철학사에서도 오래 전부터 다루는 주제야. 또 그만큼 꿰뚫어 보기가 여의치 않는 철학적 먹거리란 말이기도 하고. 그렇지 않다면야 이를 두고 계속 머리를 굴릴 이유가 없거든. 단지 휄덜린이 위 시에서 노래하는 자연과 헤겔이 자신의 미학강의에서 말하는 자연미의 그 자연과의 사이에 과연 어떠한 공통분모가 있는지에 대해선 내 나름대로 조금은 강한 물음표를 찍고 싶어. 뭐라 할까, 하늘과 땅의 차이라고나 할까, 아니 오히려 신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과의 차이라 하는 편이 낫겠구만.
나 – 인간적인 자연이라…
그 – 신적인 것이 나타내는 숭고함과는 또 다른 감각적 아름다움을 말하고자 했어.
나 – 허나 헤겔 역시 자연미의 맥락에서 양쪽을 모두 말하고 있는데…, 물론 지나가며 한 마디 던지는 식이지만 말이야.
그 – 내 보기에 문제의 핵심, 즉 자연미와 예술미를 가르는 중요 잣대는 우리 내지는 우리 의식에 보이는, 즉 주어진 아름다움이냐 아니면 우리 내지는 우리 의식이 만들어 내놓은 아름다움이냐의 가름이 아닐까 싶어. 짧게 말하자면 수동성과 능동성의 차이라고나 할까?
나 – 한 마디 거들자면, 헤겔은 자연미를 말하며 이는 자연 그 자체가 갖고 있는 아름다움이라기 보다는, 니가 말하듯, 인간의식에 아름답게 비치는 그런 것을 가리킨다고 뚜렷히 밝히고 있어. 칸트식으로 말해 ‘물자체’라기 보다는 ‘현상’ 즉 ‘나타남’이라는 말이지.
근데 헤겔철학을 이해함에 있어, 그의 미학이든 형이상학이든, 가장 중요한 점은 그 철학의 내적 운동성을 파악하는 게 아닐까 싶어. 소위 변증법으로 그려지고 있는 이러한 꿈틀거림을 제대로 그릴 수 있어야만 그가 종국적으로 무엇을 말하고자 했는지에 대해 그와 제대로 대화를 나눌 수 있거든. 예컨대 자연미는 왜 그리고 어떻게 예술미로 ‘나아갈’ 수 밖에 없는가 하는 물음에 대한 답을 구해 보는 게지.
추천0
댓글목록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